1)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실격> 초반부, 주인공의 방백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한다.
생각할수록 도무지 인간이라는 동물을 알 수 없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속이고 속는 짓을 반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끝내 그 요령을 알 수 없었기에 더욱더 익살을 떨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그 재주에 넘어갈수록 점점 더 두려워져서는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버려, 결코 인간을 이해하거나 인간과 가까워질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완전히 기억에 의존해 쓰는 것이라 거의 글짓기 수준으로 원작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2) 몇일전 포스팅한 Keane의 'Everybody's Changing'이란 곡의 가사 중, 날 심하게 흔들어 댄 부분이 있다.
I try to stay awake and remember my name
But everybody's changing and
I don't feel the same
깨어있는 채로 내 이름을 잊지 않으려 애쓰지만,
다른사람들은 모두 변한다. 그리고 난 그렇질 못하다.
3) 요즘 나는 정말 그렇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는 물음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끊임없이 자문한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뭔가 요령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언가 삶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의미없이 웃을 때, 나는 그곳에서 내가 모르는 의미를 짐작한다.
4)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아(ego)가 강한 사람이다. 아니, 이 표현은 옳지 않겠다. 나의 자아를 강하게 주장하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어떤 초자아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체득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리라 짐작한다. 마치 인간의 사랑은 숭고한 경지의 에로스(eros)가 될 수 있을지언정, 아가페(agape)에 도달할 순 없다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 말이 꼬인다.
그저 나는 나의 자아를 전단지처럼 흩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되고싶지 않은 것이다.
5) 생각해보면, 나처럼 인복이 많은 사람도 없다. 안다. 누구나 한번은 하는 말이라는 걸. 나는 스승복이 있어. 나는 인복이 있어. 나는 무슨 복이 있어 등등, 때로는 그 반대등등...
하지만, 내가 완성에 있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하지 않고 촌철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사심없이 지켜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함께한다는 것이 나에겐 큰 자부심이다.
6) 이 다음에는 꼭 몸을 써서 하는 일과 더불어 늙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맘때의 진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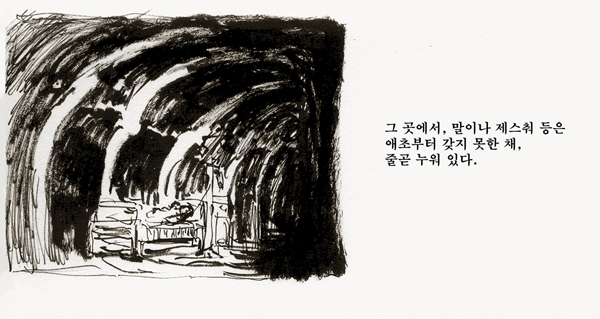
추석은 잘들 쇠셨는지?
근데 정초... 아니, 추석 연휴에 웬 별스런 꿈을 다 꾸는지.
이건 뭐, 앞뒤도 안맞고...
